더 스푼 - 타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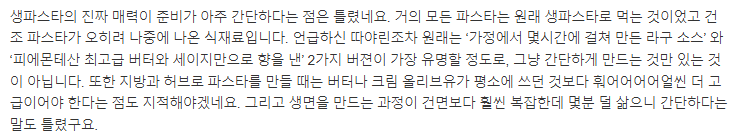
나는 기억한다. 1인당 GDP가 한국의 두 배에 달하며, '훠어어어얼씬 더 고급' 버터와 크림, 올리브유를 마구잡이로 부어 넣어 만든다는 피에몬테의 전설적인 타야린 이야기를. 고급을 쓰지 않으면 타야린이 아니다. 10년도 더 지난 지금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이탈리아를 가파르게 추격하는 수준에 이르러 '1만 불 시대'를 논하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 놀라운 마음까지 들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한국에서 재미난 타야린을 먹은 일이 있었다. 애석하게도 수입되는 버터의 종류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고, 한국에서 만드는 버터의 품질 역시 평행선을 따르고 있으니 여전히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타야린에서 일말의 좋음을 느꼈다. 넘치도록 담아낸 양 때문이 아니라, 스치는 향긋함의 편린에서 말이다.
달걀과 세몰리나, 버터, 치즈, 세이지로 완성되는 이 요리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을 대표하는 요리이며 나아가 한국 특유의 '파스타 바' 유행에 걸맞는 파스타 프레스카를 사용하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매력적인 타야린은 정작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산 수입 버터에 의존하는 우리 환경 때문일까? 그들이 고급이 아니라서? 아니면 크림이나 밀가루의 문제일까? 달걀의 노른자 때문일까? 그 고민이 제주도까지 닿아 만난 이 타야린에서는 그 어느 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는 치즈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소스를 두고는 마티니를 떠올린다. 2:1, 2.5:1의 옛스러운 비율이 있지만 3:1이나 4:1, IBA 표준은 무려 6:1이다. 버터와 치즈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버터라는 점을 생각하면 치즈가 베르무트가 되겠지만, 치즈의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버터의 맛을 가리거나 음식이 옅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의 역학은 또 다른 그림이다. 어느 것이 답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더 스푼의 타야린은 전형적인 이탈리아 북부식에 비해 치즈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자연스레 선이 굵은 감칠맛과 짠맛이 첫 한 입의 충격을 주지만 쉽게 지칠 수 있는 구성이다. 날달걀 노른자는 이를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인데, 그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세이지였다. 짠맛으로 구미를 당기지만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세이지의 향, 확실한 치감, 그리고 오래 익힐 수 없어 소스를 머금기 어려운 면을 배려하는 점도 있는 소스가 얽힌 조화이다.
주방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고급의 지방이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의 존재감보다도 지방의 보좌 역할을 수행하는 세이지가 눈부시게 빛났다. 달걀부터 치즈, 아예 지방 덩어리인 버터까지 지방으로 가득한 요리이지만, 정말 지방의 맛만으로 완성되는 요리일 수는 없는 셈이다. 좋은 지방이 있다면 좋은 요리에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지방 위에 수놓을 맛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물론 그 답이 세이지로 정해져 있는 요리지만, 세이지에 주목하는 타야린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제 그렇다고 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