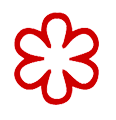Substance - 2024년 여름

파리에 샴페인을 위한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아마 셀 수 없지 많지 않을까. 하지만 그 중에서 샴페인 메이커가 관여하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많지 않고, 그 속에서도 가장 특별한 위치는 섭스탕스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샴페인과 섭스탕스,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닌가? 그렇다. 이곳은 앙셀름 셀로스가 관리하는 샴페인 리스트를 자랑으로 하는 레스토랑으로, 두 섭스탕스는 일부러 같은 이름을 맞춰 사용하고 있다.
방문 전에
섭스탕스의 예약은 온라인(thefork)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전 별도의 확인 절차는 없다.
요리

작은 요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콩테 치즈. 프랑스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기에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섭스탕스가 지향하는 요리의 콘셉트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진다. 자세한 것은 흐름을 이어나가며 이야기해 보자.


앞선 세 요리가 재료의 선택에 대한 지향을 나타낸다면 빵과 버터는 독특하게도 스타일의 지향을 나타낸다. 전형적인 데서 조금은 벗어난 캄파뉴보다도 이목을 끄는 것은 주니퍼베리를 다져넣은 버터. 진 토닉을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주니퍼의 개성이 유지방의 흔적마저 지울 듯이 주장을 펴낸다. 덕분에 빵과 버터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바로 그 진 토닉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는 생긴다. 다만 그런 질문은 있을 수 있다. 음료가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음료가 굳이 버터의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가?

유행을 지나 이제는 전형의 영역에까지 올라오고 있는 스타일의 감자 무스-태우듯 익힌 껍질은 분말을 내어 위에 뿌리고 약간의 조미로 마무리-는 어쩔 수 없는 만족감을 선사한다.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유행가처럼, 흙이나 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갈색빛의 그윽한 향 뒤로 촘촘한 감자의 질감이 입안 가득 밀려들어오는 만족감, 그리고 연어알이 더하는 감칠맛과 짠맛의 뉘앙스. 여기에 쥐라의 치즈를 살짝 더했는데, 앞으로 이 쥐라에 대한 레퍼런스는 계속하여 이어진다(굳이 하나하나 다 "이것이 쥐라다", "이 점이 쥐라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콜라비와 레체 디 티그레로 혼란스러운 페루 스타일을 연출하는 요리는 애석하게도 파리의 식당에서 기대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폴락은 기름을 정말 한계까지 머금은 듯 사진에서부터 단면에 기름에 비친 무지개를 살짝 드러내고 있으나 레체 디 티그레의 신맛에 생강, 다시 라임까지 더해지는 풍경은 흰살생선을 즐기기에는 과한 색채였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역시 단맛의 절정을 지나 꺾여가는 모습으로, 새로워 보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는 위기감을 지울 수 없었다.

쥐라를 층층이 쌓아올린 이 요리는 그 자체보다도 쥐라였다. 그려지는 그대로의 맛. 콩테와 몰토 소시지, 뱅존(다들 아시겠지만-모두 그 동네의 재료)의 전형적인 맛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알프스를 무대로 한 산악 지대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보존식품의 응축된 짠맛과 질감이 주인공이 되고 차이브로 아우러내는데, 기술은 다소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채점하려는 태도로 대하지 않더라도 어떤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콩과 바베큐처럼 오래 구운 굴의 요리는 쥐라를 벗어날 때의 약점을 드러낸다. 민트와 홀스래디쉬로 무장한 콩은 일차원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이런 류의 일본 요리에 비해 어떠한 청명함도 드러내지 않는다. 계절의 콩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는 홀스래디쉬가 전체를 지배할 뿐이다. 굴 역시도 무언가 덮고 있는 조미의 이불이 두터웠다.


이 요리는 향만 맡고도 "됐다" 싶은 느낌을 주었는데, 향의 기대를 전부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다. 밝은 점이라면 아름답게 녹인 골수와 짙게 뽑아낸 가재의 껍질향이 주는 황홀감, 제라늄이 이끄는 가재의 단맛과 올바른 질감. 두터운 껍질의 감칠맛을 맛보면서 부드럽게 녹아든 지방으로 만족감을 채운다. 하지만 자기 주장 강한 토마토가 개입하면서 그 황홀경은 급작스레 종말을 맞는다. 이쯤 되면 빵과 버터에서부터 예고되었던 섭스탕스의 스타일이 드러나는데, 일종의 절제일까, 통제일까? 흐름과 여운이 길게 이어지는 방식의 요리 대신 다음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몰입하지 않을 수 있는 스타일이 곳곳에서 개입한다. 그리고 남미를 그리워하는 생강과 라임의 재등장도.

돼지를 사용한 마지막 요리는 막상 몽펠리에의 돼지를 써서 그간의 동부 산악 지대에 대한 집념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게 만드는데, 역시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몰입을 가로막을 살구의 강한 집중도. 샹트렐은 아름답지만 말린 해초는 큰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 반드시 어떤 수준의 복잡성을 달성해야만 하는 것일까? 복잡성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두 디저트까지 와서는 이 레스토랑의 의견에 동의 여부를 떠나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 강한 주관이다. 역시 디저트의 전형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시소잎과 후추/린들 꿀과 꽃가루같은 재료의 특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둔 디저트는 앞선 요리와는 반대로 마치 식사가 이어지고 있는 듯한 감각을 전한다. 신맛과 단맛 사이의 허브 정도로 축약할 수 있는 첫 디저트보다는, 구운 반죽과 점도를 일부러 잡으느 듯한 텍스처가 눈에 띄는 뒤의 디저트에서 이러한 감상이 두드러진다. 의도는 알겠으되 과자 반죽은 전체에 비해 과했고, 꿀과 꽃가루라는 주제는 아름다웠지만 요리로 적합하게 표현되지는 않았다. 분명 미각 외적인 요소도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미각을 너무 지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총평: 섭스탕스는 두 가지 명확한 주제를 통해 자신만의 요리를 제안한다. 샹파뉴의 위인과 함께하는 레스토랑인 만큼 샴페인과 함께 흐른다면 적절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현대적인 조리 스타일 속에 프랑스의 계절을 적당히 녹여낸다. 하지만 재료의 선택과 조리 방식의 채택 어느 쪽에서도 분명한 밝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대도시라면 여느 곳에서나 이런 레스토랑을 필요로 하겠지만, 반대로 세계 여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런 요리를 반드시 찾을 것 같지는 않다. 짧은 여행이었다면 후회했을 것이고, 긴 여행이었다면 잊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쥐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곳의 요리는 분명한 성공을 거두었다. 현대 프랑스 요리가 직면한 명과 암을 모두 드러내는 스타일.
분위기: 다양성으로 가득한 젊은 도시의 활기, 다소 모자란 거리감. 대화와 음악이 뒤섞여 만드는 노이즈.
서비스: 체계적인 훈련의 느낌이 크게 보이지 않는 평범함, 쫓기는 듯 무심한 듯
음료: 샴페인 셀러만큼은 위대하다. 다만, 정작 섭스탕스 퀴베는 없을 때가 있다.
가격: 가장 저렴한 메뉴는 95유로부터 가장 비싼 메뉴는 180유로까지. 와인 포함 200-300 EUR 권장. 자크 셀로스는 파리의 가격으로 판매되므로 적당한 부담으로 마시려면 세 사람은 있어야 한다.